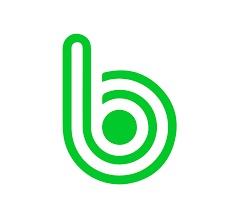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시급이 7천원대 수준으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최소보수제를 도입해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경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3권이 제한되는 등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나 캐디·택배원들을 가리킨다. 플랫폼 종사자는 배달·대리기사 등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을 받고 수입을 얻는 이들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4대 보험 등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보호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다.
이들에 대한 노동자 정의조차 불분명해 기관마다 추산하는 규모도 제각각이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200만 명으로 추정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설문조사 결과 배달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7천606원, 대리운전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6천979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었지만, 근로자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반대에 번번히 무산됐다. 올해도 적용 여부 판단을 내년으로 미뤘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등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일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경비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보수제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뉴욕시는 배달 라이더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했다. 프랑스는 특례법을 제정해 플랫폼 종사자의 종속성이 확인되면 임금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호주는 '허점막기 법'(Closing loophole Bill)을 통해 도로 운송 산업에서의 최소 노동 기준을 설정했다.
노동시간 규제 필요성도 지적됐다. 정 교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와 달리 노동시간 규제가 없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아 장시간 노동에 쉽게 노출된다"면서 "과로에 의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업무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이 아닌 최소휴식 시간제의 도입이나 최장노동 시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의 휴식과 최대 노동시간 정도를 규율해 죽을 때까지 일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 ▲ 사회보험 확대 ▲ 노사 자율교섭의 보장 ▲ 노동교육 강화 등이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노동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서도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특고·플랫폼 노동자 500여명의 의견을 들어 이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