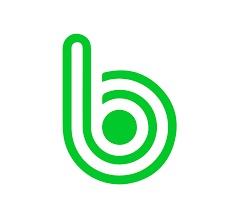수산업은 더 이상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1차 산업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데이터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글로벌 식량위기 속에서 국가 생존을 지탱할 핵심 전략 부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산업 전환의 문턱에서 스스로 한 발 물러서 있다.
2025년 해양수산부의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8,233억 원이다. 이 중 수산 분야에 실질적으로 배정된 순수 R&D 예산은 465억 원에 불과하다. 해수부 R&D의 5.6%, 국가 총 R&D의 0.14%에 지나지 않는다. 수산업의 위상과 투자의 간극은 매우 크다.
반면 노르웨이는 국가 R&D 예산의 1.5%를 수산에 투입한다. 스마트양식, 수산바이오,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세계 수산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수천억 원대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수산을 ‘블루 이코노미’로 지정하고 대규모 예산을 투입 중이다.
세계는 수산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바다에 가둬두고 있다. 여전히 장비 도입과 단기 과제 중심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기술은 보급되고 있지만 산업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수산 R&D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수산 R&D 예산을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순 기술개발을 넘는 전략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스마트양식, AI, 바이오 융합 생태계를 중심에 두고 예산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둘째,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구조가 필요하다. 현장 전문가와 디지털 인재, 지역기반 스타트업이 함께 순환하는 ‘수산산업 인재 클러스터’를 만들고, 실증과 교육이 연결되는 통합형 R&D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실증–사업화가 연계되는 ‘10년 단위 스케일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산발적 과제 대신 글로벌 기업이 참여 가능한 실증 모델과 민간 주도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수산 R&D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해수부 내 컨트롤타워를 두고, 국책연구기관·출연연·대학·기업 간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 중복을 줄이고, 협력을 높이는 오픈이노베이션 체계로 전환할 시점이다.
다섯째,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 특성화고–대학–국제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인재 육성 로드맵과 지역 캠퍼스를 확대해야 한다. 기술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수산 R&D는 단지 예산 항목이 아니다. 식량안보, 산업경쟁력,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국가 전략이다. 기술 없는 산업은 없고, 사람 없는 구조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산이 빠진 식량안보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결되지 않은 수산은 미래가 없다.